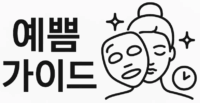나딘 라바키 감독의 영화 가버나움은 출생 기록조차 없이 살아가는 아이 ‘자인’의 시선을 통해, 존재하지만 증명할 수 없는 삶의 비극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사회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영화의 개요와 줄거리
2019년 국내 개봉한 나딘 라바키 감독의 영화 <가버나움>은 레바논의 빈민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장르의 작품입니다. 러닝타임은 126분이며, 실제 시리아 난민이었던 자인 알 라피아가 주인공 ‘자인’ 역을 맡아 세상을 놀라게 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영화는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고소한 12살 소년 자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법정에 선 자인은 “나를 태어나게 한 죄”로 부모를 고소했다고 당당히 말하고, 영화는 그가 법정에 서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갑니다. 출생 기록도 없이 수많은 동생을 돌보며 살아가던 자인은, 가장 아끼던 여동생이 팔려 가듯 시집가는 것에 분노하여 집을 나옵니다. 거리에서 불법체류자 ‘라힐’과 그녀의 아기 ‘요나스’를 만나 잠시 안정을 찾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다시 한번 혹독한 생존의 길에 내몰리게 됩니다.
존재의 증명과 사회적 책임
<가버나움>이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존재의 증명’과 그를 방치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영화 속 자인은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학교에 갈 수도, 아플 때 병원에 갈 수도 없는, 공식적으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가 부모를 고소한 이유는 단지 가난과 학대에 대한 원망을 넘어, 자신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사회적 신분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입니다. 영화의 제목인 ‘가버나움(Capernaum)’은 ‘혼돈’, ‘무질서’를 의미하며, 이는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무책임한 어른들과 시스템의 혼란스러운 상태를 상징합니다. 감독은 자인의 여정을 통해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 빈곤과 내전, 미비한 행정 시스템이 어떻게 한 아이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지를 고발하며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주의적 연출과 압도적인 연기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다큐멘터리를 연상시키는 극사실주의적 연출과 비전문 배우들의 압도적인 연기입니다. 나딘 라바키 감독은 실제 베이루트 빈민가에서 6개월 이상 촬영을 진행하며 현장의 공기를 스크린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특히 핸드헬드 카메라 기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불안정하고 거친 아이들의 현실을 관객이 직접 체험하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주인공 ‘자인’ 역의 자인 알 라피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출연진은 실제 비슷한 삶을 살아온 이들로, 그들의 연기는 꾸며낸 것이 아닌 삶 자체에서 우러나온 진정성으로 스크린을 가득 채웁니다. 특히 자인의 분노와 슬픔, 절망이 뒤섞인 눈빛은 그 어떤 대사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며 영화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감독의 작품 세계와 장르적 차별성
나딘 라바키 감독은 전작인 <카라멜>이나 <웨어 두 위 고 나우?> 등을 통해 레바논 사회의 단면을 여성의 시선과 유머를 곁들여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가버나움>에서는 이전 작품들과 달리 유머를 완전히 배제하고, 아동 인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정면으로, 그리고 매우 직설적으로 다룹니다. 이는 사회 문제에 대한 감독의 시선이 더욱 깊고 치열해졌음을 보여줍니다. 같은 사회 고발 드라마 장르의 다른 영화들과 비교했을 때, <가버나움>의 차별점은 ‘아이가 어른을 고소한다’는 독특한 법정 드라마의 형식을 차용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빈민 아동의 참상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를 주체적인 목소리를 가진 존재로 설정하여 사회 시스템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능동적인 서사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객은 동정과 연민을 넘어, 문제의 본질과 해결 방안에 대해 더욱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맺음말
영화 <가버나움>은 나딘 라바키 감독의 사실적인 연출 아래, 주인공 자인 알 라피아의 경이로운 연기가 빛나는 작품입니다. 출생 기록조차 없는 아이의 시선을 통해 존재의 의미와 사회적 책임을 묻는 이 영화는, 단순한 영화를 넘어 세상을 향한 강력한 외침과도 같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의 무거움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반드시 봐야 할 수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